|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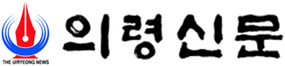
|
|
鵬程萬里(붕정만리)
장해숙의 고사성어 풀이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3일 입력 : 2020년 04월 23일
장해숙의 고사성어 풀이
鵬程萬里(붕정만리)
 |
 |
|
| 장해숙 | 붕(鵬)이란 고대 중국인의 소박한 공상에서 그려진 짐승이다. 「거대한 날짐승」 「상상 이상으로 큰 새」의 이름으로 쓰이고 있지만 실지로 본 사람은 없다. 그저 어마어마하게 큰 새라고만 생각하면 된다.
이 날짐승에 관하여 쓰인 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장자의 소요유편(逍遙遊篇)의 첫머리에 나오는 대목을 들 수 있다.
“북해의 끝에 「비」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다. 어찌나 큰지 그 길이가 몇 천리나 되는지 모른다. 이것이 화해서 붕이라는 이름의 새가 된다. 붕의 잔등 또한 그 길이가 몇 천리에 달하는지 모른다. 이 새가 한번 힘을 가누어 하늘로 올라가면 그 날개는 마치 하늘을 뒤덮은 구름인양 드넓은 하늘을 가로 덮고 바다가 온통 술렁거릴 만큼 거센 바람을 일게 한다. 붕은 이렇게 불러일으킨 바람을 타고 북해 끝에서 남해 끝까지 단숨에 내달아 날아가려 한다. 옛 세상의 불가사의를 안다는 제해(齊諧)라는 자의 말에 의하면 붕이 남해로 건너갈 때는 나래를 쳐 바다를 건너기 이천 리, 회오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기 구만 리, 그리하여 여섯 달 동안을 계속 날고 나서야 비로소 나래를 접고 쉬었다 한다.”
장자는 이 붕의 존재를 빌어 인간사회의 상식을 벗어난 무한히 큰, 아무에게도 구속되거나 구애됨이 없는 정신적 자유세계를 소요하는 위대한 자를 시사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이 장자의 비유를 근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어휘가 생겨났다. 붕곤(鵬鯤) 또는 곤붕이란 상상을 초월한 것, 그리고 붕배(鵬背) 붕익(鵬翼)이라 하여 역시 거대한 것, 특히 항공기 같은 것을 형용하는데 사용케 되었다.
또한 붕박(鵬搏) 붕비(鵬飛) 붕거(鵬擧) 등은 일대 분발하여 큰일을 이룩하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되었으며 붕도(鵬圖) 붕정(鵬程)은 범인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원대한 사업과 계획을 비유하게 되었다. 붕이 나는 하늘이라는 뜻의 붕제(鵬際) 붕소(鵬霄)라는 말도 역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붕정만리라는 것은 무려 구만 리를 솟구쳐 올라 여섯 달 동안을 계속 나는 이 새에다 관련시켜 오늘날 비행기를 타고 동서양을 이웃집 드나들 듯 하게 된 비행기 여행을 가리켜 말하게 되었다.
장자는 또한 이 대붕의 무한한 자유 위대한 존재와 비교하여 상식의 세게, 세속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찮은 잔꾀를 자랑 삼으며 기뻐하는 범속한 무리들을 가리켜
“일거(一擧)에 구만리를 나는 대붕을 보고 척안(斥鷃 작은 새)은 도리어 이를 비웃으며 “야 저놈 저 대붕이란 놈을 봐라 저놈은 대관절 어디까지 날려는 것일까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 뛰어올라 봤자, 기껏 대여섯 자 숲 위를 나는 것이 고작인데! 그래도 날아다니며 기분을 내는 것은 마찬가지 아닌가. 헌데 저놈은 어디까지 날려는 것이냐?”라고 조잘거린다. 원래 왜소한 자가 위대한 것을 알 리가 만무하니 큰 것과 작은 것과의 수작이 또한 같을 수 있으려, 라고 한 말에 의해 붕안(鵬鷃)이라는 문귀도 사용케 되었다. 크고 작은 것의 차이가 워낙 현격하다는 뜻이다.
「연작(燕雀)이 어찌 홍곡(鴻鵠)의 뜻을 알랴.」
옛날 진나라 때의 인물 진승의 고사에 나오는 이 말도 역시 붕안과 비슷한 뉘앙스를 지닌 말이다.
殺身成仁(살신성인)
공자(孔子)의 고제(高弟)의 한 사람인 증자(曾子)는
“부자(夫子)의 도는 충(忠)과 서(恕)뿐이다. 「(夫子之道忠恕而己矣」 (論語-里仁篇)”라고 말하고 있다.
충이라 함은 인간사회를 지배하는 초월적 존재인 하늘(天)에 의하여 규정된 질서와 법칙에 대하여 자신을 허탈하게 하여 따르는 정신을 말하고 서(恕)라 함은 충(忠) 즉 자신을 허탈하게 하여 하늘에 따르는 정신을 그대로 타인에게도 미치게 하는 마음을 말한다. 따라서 충과 서를 한 마디로 말한다면 자기에게 집착치 않는 진심에의 성의(誠意)와 타인에의 사려라고 말하여도 좋다.
이 충과 서를 공자는 인(仁)이라고 부른다. 증자가 지적한 바와 같이 충과 서, 즉 인이 공자에 있어서 얼마나 근본적인 관념이었는가는 완성된 인간인 군자(君子)에 관하여 “군자가 인을 떠나서 어떻게 군자가 될 수 있느냐(君子去仁 惡乎成名(논어-이인편)라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능히 상상할 수 있으리라. 그러나 공자로서는 인(仁)이라는 덕목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만을 알 뿐으로서는 무의미하였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군자가 되는 것 즉 자신의 정신이 인 그 자체로 화하는 것이었다.
“공자 가라사대 참다운 인간이 되고자 뜻하는 인사나 인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아껴 인에 배치되는 일을 하지 않으며 생명을 버려 인을 이룬다.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라는 유명한 말을 공자가 진리라고 확신한 것 앞에서 스스로 죽음을 맹세한다는 중요한 결의를 표시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증자는 이 공자의 도의 엄연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군자는 유양(悠揚)하고도 확고(確固)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까닭을 지고 있는 짐을 무겁고 갈 길은 멀기 때문이다. 지고 있는 짐이란 仁을 말하는 것이다. 어찌 무겁지 않을 소냐(士不可以不弘毅 任重而道遠 仁以爲己任, 不亦重乎 死而後已 不亦遠乎)」 보통 타인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희생하는 것을 살신성인(殺身成仁)이라고 하지마는 공자의 경우는 성인(成仁) 즉 인을 이루기 위하여 살신의 결의를 품고 있다. |
의령신문 기자 / urnews21@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23일 
- Copyrights ⓒ의령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지역
경남도의회, 반부패·청렴강화 추진실적 등 현안보고회 개최
- 반부패·청렴강화, 예산분석 및 심사 전문성 제고방안 등 논의
- 최 의장..
기고
정영만(한국자유총연맹 대구시지부 고문)..
지역사회
평창 휘닉스 파크CC.골프텔 1박2일
전병준 원로 버스전세.행사비 270만원 찬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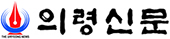
|
상호: 의령신문 / 주소: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51 / 발행인 : 박해헌 / 편집인 : 박은지
mail: urnews21@hanmail.net / Tel: 055-573-7800 / Fax : 055-573-7801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아02493 / 등록일 : 2021년 4월 1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재훈
Copyright ⓒ 의령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8,228 |
|
오늘 방문자 수 : 5,104 |
|
총 방문자 수 : 20,001,069 |
|
|
 회원가입
회원가입